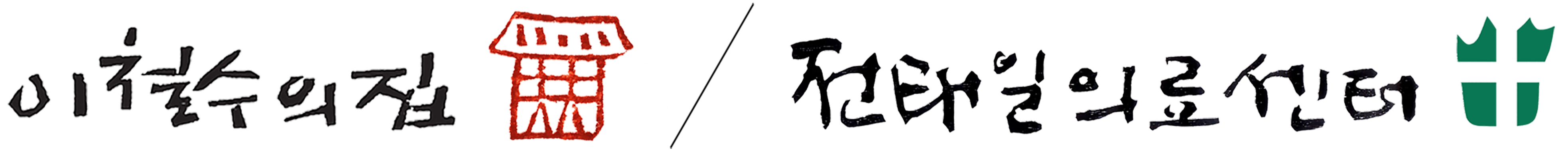전태일과 이철수, 두 이름 곁에서
전태일이 재단사로 일했던 곳이 ‘평화시장’이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평화’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에서 전태일이 목도한 것은 극심한 착취와 폭력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보는 나의 직장, 나의 행위는 분명히 인간 본질을 해치는 하나의 비평화적 비인간적 행위”라고 그는 수기에 썼다. 1970년 청년 전태일이 분신(焚身)을 통해 열악한 노동현실을 온몸으로 알린 지 어느덧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렀다.
의료대란이 심각한 요즘, 만일 전태일이 살아 있다면 어떤 일을 했을까. 산업재해로 다쳐도 제대로 된 치료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연대병원을 만들자고 했을 것 같다. 정부와 의료계가 계속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노동자를 위한 공공의료는 어느 쪽의 고려 대상도 아니다. 그런데 전태일의 이름으로 그의 정신을 실현할 병원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녹색병원 본관 옆의 부지에 지어질 전태일의료센터가 바로 그곳이다.
그 모체인 녹색병원은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이 직업병을 인정받아 받은 보상금으로 건립한 병원이다. 노동자의 소중한 핏값으로 지어진 병원 곁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태일의료센터가 세워지는 것이다. 돌봄의 대상에는 비정규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뿐 아니라 가난한 여성과 아이 등 사회적 약자들도 포함된다. 차비를 아껴서 어린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 주고 자신은 먼 길을 걸어 퇴근했던 전태일. 이러한 정신을 이어나갈 노동자병원을 만들기 위해 모금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모금액은 턱없이 부족하고,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태일의료센터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이철수 판화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은 정말 반갑고 감사하다. 이철수 선생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판화가로, 1980년대 민중미술에서 시작해 자연과 생명의 본성, 인간에 대한 성찰 등으로 작품의 폭을 넓히며 국내외에서 수많은 개인전을 열었다. 그의 판화에는 선생이 오래 터 잡고 살아온 충북 제천의 평화로운 풍경과 일상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정감 있고 깊은 사유에서 나온 문장들이 특유의 필체로 적혀 있다. 그래서 간결하고 단아한 이미지와 화두처럼 꽂히는 문장이 조화를 이룬 그의 작품을 가리켜 ‘그림으로 시를 쓴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의 마음이 전태일이라는 이름과 만나서 오는 11월 6일 인사아트센터에서 <큰그릇이야, 늘 나누기 위한 준비!>라는 전시회를 하게 되었다. 출품될 판화를 일별해보아도 전시의 취지가 잘 읽힌다. 병풍 3점을 포함해 총 58점이 전시되는데, 폭넓은 시기만큼 노동과 휴식, 연대와 공생, 사랑과 나눔 등 주제도 다양하다. 누구나 즐겨 소장할 수 있는 대중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어떤 공간에 걸어도 따뜻하고 기품있는 작품들이다.
이철수 선생은 평생 예술가로 살아왔지만 오래도록 손수 농사를 지어온 농부이기도 하다. 그래서 논과 밭에서 일하는 농부의 모습이나 풍경이 자주 등장한다. <일하는 날>(2000)에는 벼포기들이 한 획 한 획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벼포기 사이로 몸을 굽혀 일하는 부부와 함께 나비, 벌레, 잡초 등이 아주 작게 보인다. “종일 논에서 살았다. 우리는 갈수록 작아진다 거머리처럼 나비처럼”이라는 문장이 말해주듯이, 농사일은 사람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과 실감을 갖게 한다.
<좋은 날>(2003)에서는 “꿈 없는 잠처럼 잡념 없는 노동 그 안에서 언제나 좋은 날”이라는 문장과 함께 노동하는 몸의 다양한 자세를 곡선으로 유려하게 표현하고 있다. <녹색 땀을 흘리는 한낮>(2003)에서는 아낙들이 나란히 김을 매고 있는 밭고랑이 대지에 쓰는 옛편지로 비유되기도 한다. 이처럼 농부 화가로서 정직하고 겸손한 노동을 하며 살아왔기에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에도 ‘큰그릇’ 같은 마음을 내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좋은 인연>(1999)은 가로획과 세로획이 씨줄과 날줄처럼 성글게 교차하며 얼핏 대바구니나 옷감의 결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다시 보니 그 선들이 지그시 웃고 있는 얼굴들 아닌가. “웃는 얼굴로 서로 의지하면 좋은 인연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문장처럼. <우리들의 길>(2007)이라는 작품에는 “당신의 길을 함께 걸으면 언젠가 우리들의 길이라 부르게 되겠지”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 경사가 다른 몇 개의 길 위로 걷고 있는 사람들. 선 몇 개로 갈무리된 군상은 다양한 표정과 자세를 지닌 채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하늘에서 길과 사람들을 비추고 있는 해와 달 또한 유구한 세월을 나타내며 기운을 보태고 있다. 이렇게 좋은 인연이 만나 서로 의지하고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 가는 모습은 이철수 판화가 내내 추구해온 공생과 공경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
문익환 목사가 쓴 〈전태일〉이라는 시를 다시 읽으며 “전태일 아닌 것이 있겠는가 / 가을만 되면 말라 아궁에도 못 들어갈 줄 알면서도 / 봄만 되면 희망처럼 눈물겨웁게 돋아나는 / 풀 이파리들이여 / 그대들의 이름도 전태일이던가 / 그야 물으나 마나 전태일이지”라는 대목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 “무엇 하나 전태일 아닌 것이 없다”는 구절처럼, 우리 모두가 전태일이다. 전태일이라는 이름 곁에 이철수라는 사랑의 이름이 놓이니, 세상이 한결 환해지는 듯하다.
나희덕 (시인,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